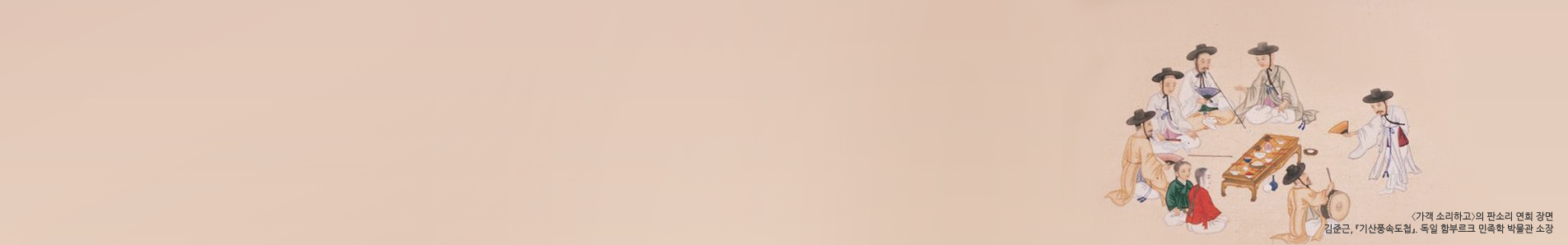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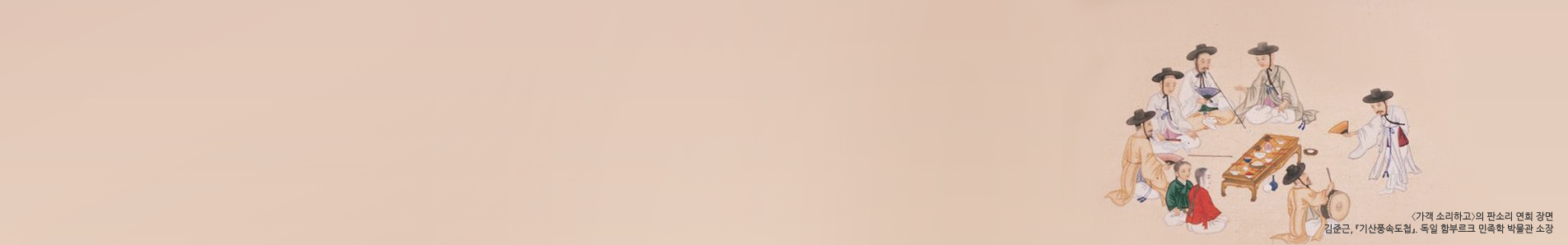
판소리 용어 중에서 '판소리'라는 말 말고 가장 널리 알려진 말이 바로 '서편제'일 것이다. 공전의 대히트를 한 영화 [서편제] 때문에 '서편제'라는 용어가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막상 이 용어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온갖 오해가 난무하고 있어서 차분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서편제라는 용어는 넓게 보면 '제'라는 개념 속에 있는 또 하나의 작은 개념이다. 그래서 '제'라는 개념을 우선 알아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하기로 한다.
판소리 '제'의 쓰임새를 보면 그 범위가 상당히 넓지만, 일반적으로는 유파의 개념으로 쓰인다. 판소리에서 유파의 구분이 생기게 된 것은 일단, 판소리가 발전하여 다양해지고, 이 다양한 판소리를 간추려서 이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다양한 판소리를 유형화하여, 비슷한 양식끼리 한 데 묶어 구분을 해본 것이 '제'라는 개념으로 형성되었다는 말이다.
'제'라는 용어가 처음 나타나는 문헌은 1940년 조선일보사 출판부에서 나온 정노식의 {조선창극사}이다. {조선창극사}는 90명에 이르는 명창과 명고수의 간략한 전기와 더늠들을 모아놓은 책인데, 책의 앞부분에서 판소리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언급하는 가운데, '대가닥(전승의 큰 줄기라는 의미)'이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제'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명창의 이름 아래 '동편'이니, '서편'이니, '중고'니 하여 '제'의 구분을 했다. 그 이후 많은 사람들에 의해 '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오죽하면 모든 소리꾼들을 동편제나 서편제 중 하나에 포함시키는 거대한 도표를 만들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제'의 구분을 최초로 시도했던 {조선창극사}에서는 모든 소리꾼들을 다 동편, 서편, 중고 등으로 구분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제'의 시조로 알려져 있는 전기 8명창들의 경우에는 아무도 '제'의 표시가 없다. 그러니까 '제'라는 것이 애초부터 있어서 '나는 이런 소리를 한다'고 표방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판소리가 다양해지고 복잡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제'라는 관념이 생겨나 구분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라는 말과 개념은 후대에 생겨나 점점 발달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제'에 관해 논의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섬진강 동쪽 지역인 남원·순창·곡성·구례 등지에 전승된 소리로서, 가왕으로 일컬어지는 운봉 출신의 송흥록의 소리 양식을 표준으로 삼는다. 우조(씩씩한 가락)의 표현에 중점을 두고, 감정을 가능한 절제하며, 장단은 '대마디 대장단'을 사용하여 기교를 부리지 않는다. 발성은 통성을 사용하여 엄하게 하며, 구절 끝마침을 되게 끊어낸다.
섬진강 서쪽 지역인 광주·나주·담양·화순·보성 등지에 전승된 소리로, 순창 출신이며 보성에서 말년을 보낸 박유전의 소리 양식을 표준으로 삼는다. 계면조(슬픈 가락)의 표현에 중점을 두며, 발성의 기교를 중시하여 다양한 기교를 부린다. 소리가 늘어지는 특징을 지니며, 장단의 운용 면에서는 엇부침이라하여, 매우 기교적인 리듬을 구사한다. 또한 발림(육체적 표현. 동작)이 매우 세련되어 있다.
충청도와 경기도 지역에 전승된 소리로, 송흥록과 동시대 사람인 강경 출신 김성옥으로부터 출발되었다. 음악적 특색은 비동비서(非東非西), 혹은 동·서편의 중간인데, 일제강점기 이후 전승이 끊어졌다.
위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제'에는 동편제·서편제·중고제의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제' 구분의 기준은 전승 지역·전승 계보·음악적 특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고제의 경우, 현재는 전승이 끊어져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음악적 특성에 관해서도 '비동비서'니, '동·서편의 중간'이니 하여,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실체나 개념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동편제와 서편제이다.
우선 동·서편의 구분이 전승 지역에 따라 가능할 것인지 생각해 보자. 주지하다시피 판소리는 사람이 지니고 있으며, 사람은 한 곳에 붙박혀 사는 게 아니고, 마음대로 옮겨다닐 수 있다. 교통이 불편하여 내왕이 적었던 전통 시대에는 그래도 옮겨다니는 범위나 횟수가 적었지만, 개화 이후에는 교통의 발달로 소리꾼의 내왕이 전국적인 범위로 행해졌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의 소리가 꼭 그곳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전승 지역에 따른 판소리 '제'의 구분은 개화 이전에는 어느 정도 가능했을지 몰라도, 현대에 오면 전혀 타당성이 없게 되었다. 더구나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예술 양식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소리꾼이 어디 출신이라고 해서 바로 서편제 소리꾼이니, 동편제 소리꾼이니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에는 전승 계보에 대해 살펴보자.
판소리는 전승 예술이다. 그러니까 판소리꾼이 자신의 예술 세계를 구축하는 데는 어떤 소리를 전수받았는가가 일차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나 판소리 창자들은, 특히 창조성이 강한 창자들은 선생에게 배운 대로만 소리를 하지는 않는다.
반드시 자기 나름대로 창조성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동편제 소리의 정통 가문 출신이었으면서도, 새로운 양식의 소리를 개발하여 가문으로부터 독살 당할 뻔했던 송만갑 같은 사람이 좋은 예이다. 그러니까 동편제 소리꾼의 제자라고 해서 바로 동편제 소리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요사이는 또 많은 선생으로부터 다양한 소리를 전수받는 경향이 점점 더 늘고 있으며, 그런 사람일수록 명창 소리를 듣는 사람이 많다. 따라서 전승 계보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몇몇 이유로 인하여 전승 계보 또한 판소리 유형을 나누는 효과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하다. 예를 들자면 김소희 같은 사람은 처음에는 가장 전형적인 동편제 소리꾼인 송만갑에게 배웠으나, 나중에는 전형적인 서편제 소리꾼인 정정렬과 박동실에게 배워 자신의 예술 세계를 완성했다. 그러면 전승 받은 것만 보아서는 김소희의 '제'를 무엇이라고 해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또 이런 경우도 있다. 예컨대 강도근처럼 전형적인 동편제 소리를 했던 송만갑과 김정문, 유성준에게만 배우고, 송만갑과 김정문의 소리 양식만을 끝끝내 고집한 경우이다. 이럴 때는 보다 쉽게 동편제 소리꾼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음악적 특성에 의한 구분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검토해 보자. 앞에서 동편제 혹은 서편제 소리의 특성으로 든 사항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판소리가 공유하는 특질이다. 모든 판소리는 대마디 대장단과 엇부침을 지니고 있으며, 또 경우에 따라 소리 끝을 끊어 내기도 하고, 늘여빼기도 한다. 이러한 상반되는 특질을 모두 갖추어야 한 편의 예술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위에서 든 어느 한 쪽의 특성만으로는, 앙상한 추상물에 지나지 않아서 온전한 예술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순수한 동편제 소리니 서편제 소리니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는 것은 동편제와 서편제라는 관념일 뿐이다. 결국 이 음악적 특성이라는 것도, 어떤 소리가 어떤 관념에 더 근접한 것인지를 가리는 기준으로 사용할 때만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이제 '제'라고 하는 것은 현대 판소리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으로는 더 이상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판소리를 대할 때 '제'라는 틀로 판소리를 보고 있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판소리를 바라보는 방식이 아직 만들어지지 못 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더 이상 소설을 바라보는 방식으로는 실효성이 없는 낭만주의니 사실주의니 하는 잣대로 현대 소설을 재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도 유효한 것은, 그것마저 없으면 판소리를 유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라는 용어를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판소리를 바라다보는 하나의 기준으로만 생각하면, '제'라는 용어는 판소리를 이해하는 데 퍽 유용한 개념이 될 수 있을 것이다.